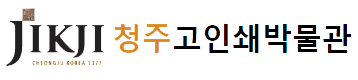[우리말로 깨닫다] 고 새(세) 회수
사이시옷을 쓰는 특별한 예외들: ‘곳간, 셋방, 횟수, 숫자, 찻간, 툇간’
조 현 용 / 경희대학교 교수·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는 무엇을 줬다가 금방 빼앗는 것을 농담으로 ‘고 새 회수’라고 한다. 이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실 나 역시 약간 억지스러운 도입이라는 생각이 든다. 맞춤법 강의를 하다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예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자 사이에 사이시옷을 쓰는 예들이다. 원래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경우에 한쪽이라도 순 우리말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자어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한자어에서 뒤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거나 니은 음이 덧나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표기법(表記法)’의 표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표깃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보통 맞춤법에서 예외를 만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법은 관례다.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렇게 쓴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례 때문에 맞춤법이 어려워지고, 복잡하여 졌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예외를 줄이는 것이 맞춤법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자어 사이의 사이시옷 표기도 관례라는 설명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어휘 중에 ‘찻간(車間)’과 ‘툇간(退間)’의 경우는 사용은커녕 뜻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찻간은 ‘기차나 버스 따위에서 사람이 타는 칸’이라는 뜻이다. 알고 있었는가? 툇간은 더 어렵다. 툇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안둘렛간 밖에다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설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찻간이나 툇간 같은 어휘야말로 예외로도 설명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한다. 최소한 관례라고 이야기하려면 자주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그야말로 시험 출제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국어시험이나 국어실력 평가문제에 보면 이런 어휘들이 출제된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들은 찻간, 툇간 같은 문제는 출제도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국어공부가 재미없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한자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쓰이는 예는 모두 여섯 개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2음절의 한자어 여섯 개라고 해야 한다. 앞에 두 개의 어휘를 제시했으니 남은 어휘는 모두 네 개인 셈이다. 찻간과 툇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외울 필요는 없고, 나머지 네 개는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편이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횟수(回數), 숫자(數字)’가 네 개의 예외인데, 예외의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례이다. 관례라고 설명하면 외우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글의 맨 앞에 엉뚱하게 '고 새 회수'라는 농담을 써 놓은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렇게라도 외워두지 않으면 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한다. 아마 이 네 단어를 외워본 경험이 있으면 내 이야기에 쉽게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줬다가 금방 뺐다.’라고 하는 ‘고 새 회수’라는 농담을 기억하고 새를 ‘세’로 바꾸면 한동안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곳간, 셋방, 횟수, 숫자, 찻간, 툇간’은 우리를 괴롭히는 예외들이다.